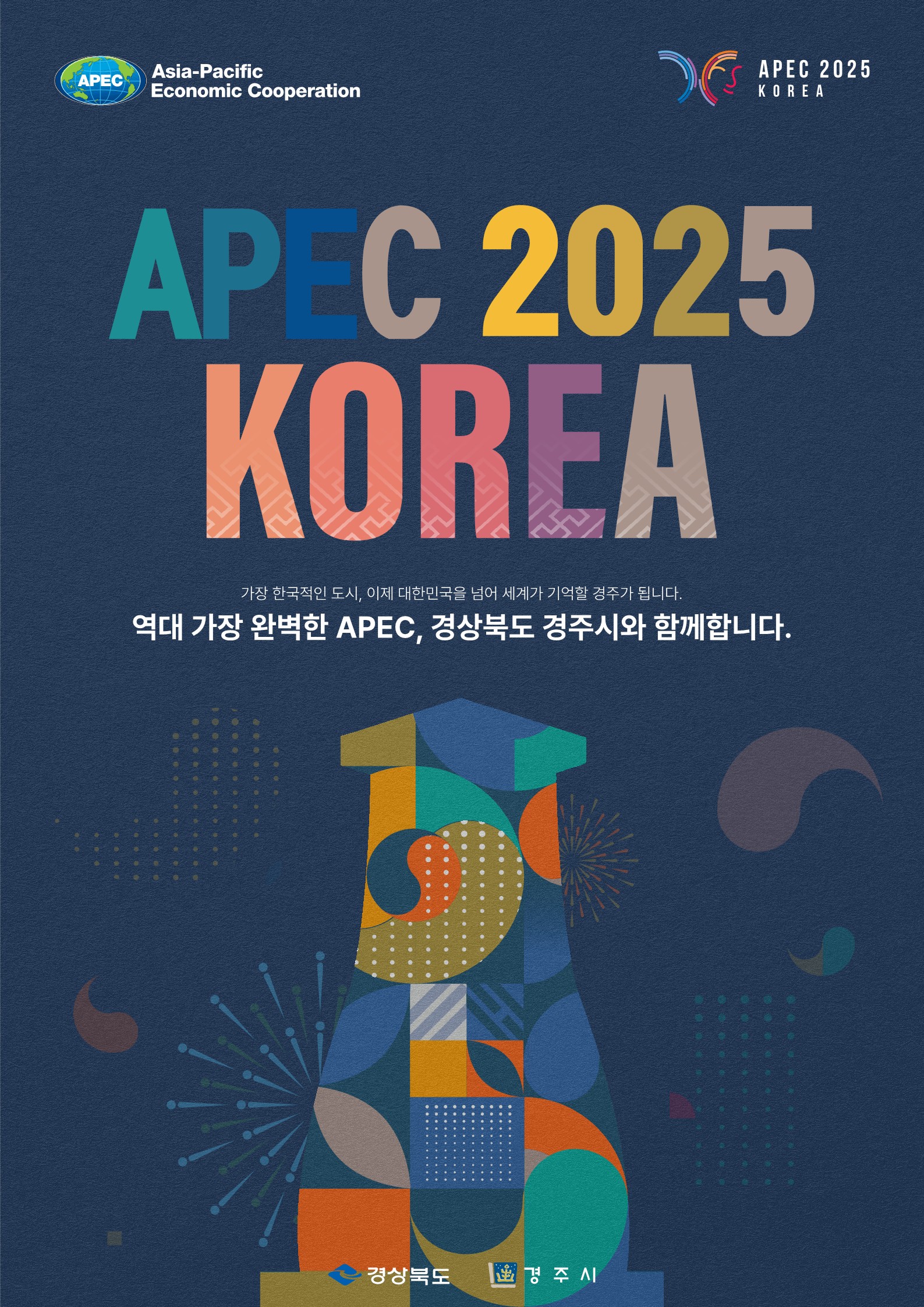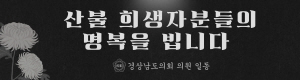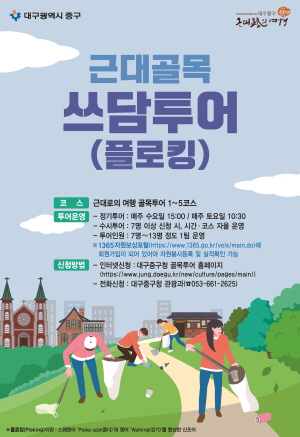- |
- UPDATE : 2025년 07월 10일 목요일
-
강릉
 4℃
4℃
-
경주
 6℃
6℃
-
광주
 7℃
7℃
-
광주
 5℃
5℃
-
군산
 8℃
8℃
-
대구
 6℃
6℃
-
대전
 5℃
5℃
-
마산
 7℃
7℃
-
목포
 7℃
7℃
-
부산
 8℃
8℃
-
삼척
 0℃
0℃
-
서울
 8℃
8℃
-
속초
 8℃
8℃
-
수원
 6℃
6℃
-
순천
 8℃
8℃
-
여수
 7℃
7℃
-
여주
 4℃
4℃
-
원주
 3℃
3℃
-
의정부
 8℃
8℃
-
인천
 6℃
6℃
-
전주
 7℃
7℃
-
제주
 12℃
12℃
-
진주
 7℃
7℃
-
창원
 7℃
7℃
-
천안
 6℃
6℃
-
포항
 6℃
6℃
-
도시철도 6개 기관 “무임손실, 더는 감당 못 해”
서울교통공사 등 “국비 보전 법제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돼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동건의문 전달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6곳(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의 노사 대표들은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용우 의원을 만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처한 재정 위기를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무임수송 방식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재,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6개 기관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캠프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금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자리한 12명의 노사대표는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체계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서, 도시철도가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임을 강조했다.
도시철도는 수송량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손꼽힌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도시철도”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 년 동안 정부는 운영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없이 제도를 유지해 왔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00년 234억 원에서 2023년 4,135억 원으로 증가했고, 1992년 이후 누적 손실은 5조 8,743억 원에 달한다. 6개 기관 전체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58%는 무임수송에 기인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와 동일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보전을 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이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료 부담도 커졌다. 2023년 기준 6개 도시철도 기관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에 비해 1,085억 원(62.5%) 증가했다.
백호 사장은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이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T ISSUE
1이재강 의원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위한 개정법 발의 2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3“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4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5이재정 의원 , ‘ 요양보호사의 날 ’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6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7박정현 의원, 당원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 교육 실시 8김주영 의원, 인하대학교 총장·병원장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 점검 9광주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들어선다 10이수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